
기억이 머문 자리
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6

삼청동 골목에서 사랑을 속삭이다
지역트래블투데이 LIST-i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6-08-08
크리스마스 사랑의 기적
지역트래블투데이 LIST-i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4-12-24
복사뼈에 대한 단상
지역세종특별자치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7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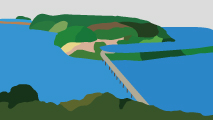
구슬픈 소리가 들려오는 곳
지역충청북도 충주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7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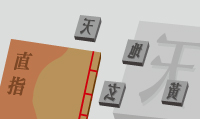
두 글자에 담긴 도시
지역충청북도 청주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7

쉴 곳이 필요한 자에게
지역충청북도 청주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7

추억의 다리
지역충청북도 진천군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7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